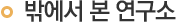[책과 삶] 남남갈등의 상징 국립묘지, 이젠 화합의 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윤해동|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 죽은 자의 정치학…하상복 지음 | 모티브북 | 479쪽 | 2만3000원
베네딕트 앤더슨은 그의 기념비적 저작 <상상의 공동체> 첫머리에서, 무명용사의 기념비 혹은 무덤을 근대 민족주의의 상징적 기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명용사의 무덤에는 유골이나 영혼 대신에 온갖 기괴한 민족적 상상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총리 혹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언제나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정치 문제로 비화한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사자를 ‘추도’하거나 ‘현창’하는 종교시설로서 신사 참배가 전쟁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에는 그 나름의 맥락이 존재한다.
민족주의의 문화적 기원을 이루는 ‘무명용사의 비’와 일본의 전쟁책임을 상징하는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개입하는 이런 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국민국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국립묘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리9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목포대학에 근무하는 저자 하상복은, 문화와 상징이 정치, 특히 권력과 맺는 관계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소장 정치학자이다. 그는 죽음 혹은 사자가 권력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을 위해 동원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분석한다. 국립묘지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국가를 물질적으로 ‘재현’하고 ‘애국’이라는 가치를 감성과 정념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립묘지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국립묘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른바 ‘사자의 비교정치학’을 동원한다. 근대 국립묘지의 원형인 프랑스 팡테옹(만신전)과 국립묘지의 ‘군사주의’ 모델을 제공하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한다.
한국에서 국립묘지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들을 안치한” 곳을 지칭한다. 국립 서울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로 출발하여 1965년 국립묘지로 ‘격을 높여서’ ‘국가에 유공한 민간인’에게까지 안장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현재 무명용사 11만여 기를 포함한 16만여 기를 안장하고 있다. 한편 국군묘지에서 출발한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 및 세 개의 호국원, 여기에 세 개의 민주묘지가 있어 국립묘지는 모두 8개에 이른다. 전자는 대개 ‘반공군사주의’를 체현한 인물들이 영면하는 곳인 반면 민주묘지는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상징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한국의 국립묘지는 이념의 장을 가르는 남남갈등의 동학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한 달 뒤 보수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 회원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호국영령을 외면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묘지 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에 저자는 프랑스와 미국의 국립묘지가 대결과 갈등의 표상으로부터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변화해 왔듯이, 한국의 국립묘지 역시 갈등과 대결의 상징으로부터 화해와 공존의 정치공간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죽은 자’와 죽음이 표상하는 바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대에 들어 죽음은 ‘위생 처리’되어 일상적 삶과는 완벽하게 분리된다. 장례는 대개 병원에 부속된 영안시설에서 진행되며 장례 이후 죽음은 일상과 완전히 절연한다. 대신에 근대의 죽음은 압도적으로 정치화한다. 이는 전근대의 죽음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전근대의 죽음은 일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효와 제사를 통해 작동하고 있었다. 전근대의 일반적인 죽음은 지극히 개별적이거나 기껏해야 가족 혹은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제왕들의 ‘죽음 의례’가 의미하는 가장 궁극적인 서사가 ‘영웅의 서사’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개별적인 차원에 놓여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죽음은 정치화되는 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첫째, 제사 혹은 정치적 죽음의 의례는 상징화되어 국민 혹은 국가의 의례로 상승한다. 둘째, 권력자의 죽음도 국민으로 호명되는 존재 일반의 죽음으로 전환하며 그들은 국립묘지에 묻힘으로써 “국민이라는 집단적·전체적 인격체로 통합 혹은 용해”된다. 전자는 죽음의 정치학이 갖는 연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대적 죽음의 특성을 지적하는 것이겠다. <죽은 자의 정치학>이 다소 평면적인 분석에 머무르고만 이유는 죽음과 제사의 연속성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정치학’과 ‘죽은 자의 정치학’은 다르다. 죽음의 정치학은 죽음을 대상으로 하거나 ‘죽은 자’와 ‘산 자’의 소통 혹은 대화에 바탕을 둔 정치학일 수 있다. 반면 죽은 자의 정치학은 ‘죽은 자’를 대상화하거나 ‘산 자’만에 의한 정치학이 된다. 죽음과 ‘죽은 자’가 표상하는 차이는 이처럼 크다.
무명용사의 비와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거리는 바로 죽음과 죽은 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무명용사의 비에는 죽음 자체를 추모하는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으나 야스쿠니신사의 의례에는 죽은 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감각이 훨씬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국립묘지는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거친 이후 국군묘지에서 출발하여 민주묘지를 포용함으로써 남한 내부의 갈등과 통합을 상징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그게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든-국립묘지는 남북한 화해와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묘지는 우리가 가야할 멀고 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리라! 그 길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정치학’을 ‘죽음의 정치학’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국립묘지가 평화와 공존의 전당으로 그리고 국민화합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